복상사(腹上死)는 왜 발생하는가?(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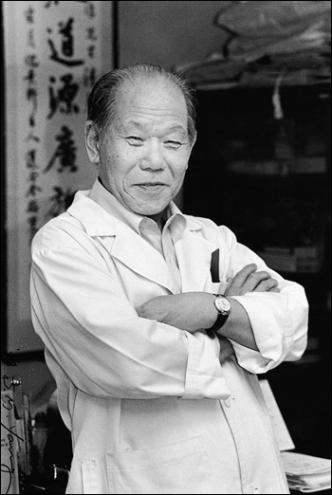 귀금속계 대부 K씨가 쓰러진 사연
귀금속계 대부 K씨가 쓰러진 사연
1969년 가을 서울 후암동. 귀금속계의 대부라고 할 만한 K씨가 쓰러졌다. 전쟁 통에 단신으로 월남한 K씨는 자수성가한 인물.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후했던 까닭에 K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500여 명의 후배 상인들이 발 벗고 나서서 용하다는 의사와 약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나도 그 틈에 끼어 그가 쓰러진 날 밤에 불려갔다.
급하게 나를 데리러 온 사람과 함께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밤이었다. 집에 있던 사람들은 서둘러 나를 환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나는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가 방문을 열어주었지만 나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방안에 누워 있는 그를 멀찍이 두고 보았다.
우아하고 깨끗한 방이었다. 방안에 놓여 있는 가구며 장식품도 세련되어 보였다. 나는 방 아랫목에 누워 있는 K씨를 지긋이 쳐다보았다. K씨는 정신을 잃은 채 계속 딸꾹질을 했다. 환갑이 가깝다는 K씨에 비하면 상당히 젊어 보이는 부인이 그의 옆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고 일어섰다. 그런데 내가 방으로 들어서지 않고 계속 문 앞에 서 있자 표정이 어두워져서 물었다. “뭐가 잘못 됐나요? 왜 안 들어오시고….”
“아, 아닙니다. 급히 오느라 숨이 좀 거칠어져서 가라앉히려는 겁니다. 아무리 의식을 잃은 환자지만 주변의 움직임은 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가다듬고 맥을 안정시킨 다음에 환자에게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환자의 상태도 정확하게 살필 수 있고요.”
부인은 머리를 끄덕이며 옆으로 비켜섰다. 부인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나는 나름대로 환자가 죽을병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보면 환자의 얼굴색이 잘 보인다. 얼굴에 광택이 있는지도 가까이 볼 때보다 좀 멀리서 볼 때 더 잘 보인다. 안색은 환자의 상태, 다시 말해 병의 깊고 얕음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자 척도이다.
전설의 의서 <황제내경> ‘소문(素問)-오장생성편(五臟生成篇)’에서는 안색에 대해 이렇게 이르고 있다. “얼굴이 왕골풀 같이 푸르면 죽을병이나 물총새 날개와 같다면 산다. 얼굴이 탱자와 같이 누렇게 되면 죽을병이나 게의 배와 같다면 산다. 얼굴색이 그을음 같이 까맣게 되면 죽을병이나 까마귀 날개와 같다면 산다. 얼굴색이 코피와 같이 붉은색이면 죽을병이나 닭의 벼슬과 같다면 산다. 얼굴색이 백골처럼 하얗게 되면 죽을병이나 돼지의 지방과 같다면 산다.”
어찌됐든 얼굴에 나타난 색에 광택이 없다면 병이 아주 깊어진 것이니 돌이킬 가망이 없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명의(名醫)는 죽을병을 잘 안다고 했다. 그리고 술자는 신이 아니니 이미 명(命)이 다했으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어찌 할 도리가 없다. 나는 환자가 혼수상태이면서도 딸꾹질을 계속하고 있어 쉽지 않음을 느꼈다. 멀쩡한 사람도 딸꾹질을 사흘만 계속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K씨의 얼굴은 해쓱하고 창백했으며 푸른 기가 돌면서 광택도 거의 없었다.
“환자가 왜 쓰러지게 되었는지 혹시 집히는 게 있으세요?”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은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했다. 평소 혈압이 높은 편이기는 했으나 건강했고 혈압으로 쓰러질 만큼 충격을 받은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 동안 방 밖에 서서 망진(望診)한 바로는 음혈(陰血)이 고갈된 것이 분명했다. 얼굴색이 사색에 가까워져 있고 입을 벌리고 딸꾹질을 하는 양태로 보아 거의 틀림없었다.
